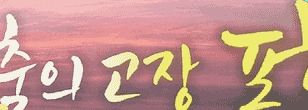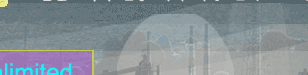| |
그렇게
황망한 순간이 지나가는가싶더니 어느새 형산강 다리를 건너와 있었다. 저만치 인덕산 주위론 짙은 땅거미가
내려앉아 한층 어둡게만 보였다.
“안자, 혼자 갈 수 있겠지예?”
“예, 그간 고마웠어요?”
그렇게 시원찮게 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포*철 정문 쪽이 훤하게 비춰들었다.
“자-, 잠깐만요?”
“왜 그러는데예?”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하고선 나를 쳐다보았다.
“저기도 물이 꽉 찬 것 같은데요?”
“그래예?”
우리는 종종걸음으로 신호등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도 물바다이긴 마찬가지였다.
형산강 하류라 곳곳이 물에 잠겨있었다. 잠시 잠잠하였던 빗방울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혼자
가기엔 무리일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집까지 바래다 줄께요.”
“안 그래도 되는데, 이거 미안해서 우야지예?”
속으론 내심 반기는 눈치였다.
“괜찮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지예.”
“지사 좋지만 올 땐 또 혼자 와야잖아요?”
“괜찮아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던 터라 대답도 거침이 없었다. 이미 내뱉은 말을 되물릴 순 없늘 일,
나는 주적주적 내리는 비를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다.
“야~호~!”
길게 내지르는 소리에 길가를 환하게 밝히는 가로등 밑으로 굵직한 빗방울들이 엷은 사선을 그으며 멀어져갔다.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꽃가루처럼 갖가지 오묘한 빛을 내며 연달아 펼쳐지는 주황빛 색조! 가히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펼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 이에 그녀도 기가 동한 듯 물을 튀기며 저만치
앞서 달리기 시작했다. 순간 나는 한껏 펼친 채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야-아---”
어느새 쫓기는 신세가 된 그녀는 젖은 옷깃을 팔랑이며 보도블록 가로수길을 거침없이 달려갔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저만치 앞서 달아나던 그녀 주위로 뭔가 희끔한 것이 그녀의 몸을 스르르 감싸는 것 같았다.
‘뭘까?’
고개를 내밀어 전방을 살피기가 무섭게 길다랗게 드리워진 수양버들가지가 ‘휘-잉’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에 못이겨 옆으로 비스듬히 드러눕기 시작했다.
“빨리 도망쳐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리나케 달렸다. 갑작스레 덜미가 잡힌 사슴마냥 잠시 어리둥절해 하더니
머리맡으로 길게 드리워지는 수양버들 가지를 보고서야 비로소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철퍽철퍽 물을 튀기며
그렇게 한동안 달리고 있자니 뒤에서 갑자기 ‘뿌지직’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등골이 오싹한 순간이
지나자 그녀가 느닷없이 발을 절뚝절뚝 절기 시작하더니 이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아니, 왜 그래요?”
나는 화들짝 놀라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다.
“아무래도 발을 삐었나 봐요.”
“예-에?”
나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쭈그리고 앉았다.
“그럼 제 등에 업히세요.”
나는 보채듯 그녀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일으켜 세웠다.
“자-, 잠깐만요.”
그녀는 애써 미안한 마음에선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야!”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라지 말고 제 등에 엎히라니깐요?”
“아니예요. 여기 잠깐만 앉아있다가 가요.”
“.....”
“조금 있으면 괜찮아 질 거예요. 일단 숨 좀 돌리고... 미안해요.”
벌써 사방은 칙칙한 어둠에 휩싸였고 쌀쌀한 냉기가 전신을 감쌌다. 그녀도 한기가 드는 듯
입을 벌벌 떨며 어쩔 줄 몰라했다.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앉아 있을 순 없는 일, 나는 다시 그녀의
팔을 움켜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갑시다. 여기 이렇게 있다간 오도가도 못하겠어요.”
그녀도 입술을 꽉 깨문 채 자리에서 일어나 몇 자국 발을 옮기는가 싶더니 다시 주저앉았다.
도저히 안되겠던 모양이었다.
“고집부리지 말고 제 등에 엎히세요.”
“괜찮겠어요?”
“가다가 힘들면 쉬엄쉬엄 쉬었다 가면 되지요.”
그렇게 우리는 인덕산 자락을 벗어나고 있었다. 후줄근히 내리던 빗방울도 어느새 가늘어지고
등걸짝에선 허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기에 몸이 굳은 그녀가 등에 몸을 바짝 붙이고선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발길을 옮길 적마다 그녀의 풍만하고도 부드러운 살결이 등걸에 전해져 왔다. 그녀도
애써 싫지 않은 듯 나의 목을 꽉 껴안은 채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내뻤었다. 그녀를 받치고 있는 손에서
땀이 흥건하게 배어들었고,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따사로움이 가득 전해져 왔다. 그녀의 가슴 언저리에서
따스한 기운이 배어들었고, 발걸음을 옮길 적마다 허리춤에 와닿는 그녀의 비밀스런 그곳, 난 허리춤에
와닿는 그 느낌이 너무나 좋았다.
“힘들지예? 그라지 말고 내려 주세요. 안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예? 그라머 조~기 버스 정류장까지만 갈께예.”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내려놓고 싶었건만 대답은 영 딴 판이었다. 손에 힘은 빠질 대로 빠져있었고,
등걸에 매달린 그녀는 자꾸만 아래로 처졌다.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알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겠다는 심사는
도대체 어디서 연유하는 걸까? 나는 뒤뚱거리는 몸을 이끌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파출소를 지나 저만치
앞에 정류장이 보였다. 마음 같아선 단숨에 달음박질치고 싶었건만 한걸음 한걸음이 천근만근 같았다. 그렇다고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내려놓자니 자존심이 쉽사리 용납칠 않았다.
‘그래, 이제 몇 발짝만 가면 돼.’
나는 목을 길게 빼고선 안간힘을 다해 걸어갔다.
“미안합니다. 이제 내릴께예.”
“괜찮겠어요?”
하늘이 노-래지는 기운을 뒤로 한 채 그녀를 살며시 내려놓았다.
마을 어귀로 접어들자 길 양 옆 아파트 단지에서 누런 황톳물이 질질 흘러내려 도로는 온통
물바다였다. 억수같이 퍼부어대는 폭우에 저지대 고지대 할 것 없었다. 그저 길이라는 길은 온통 누런
황톳물뿐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