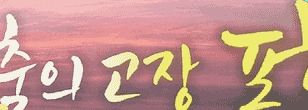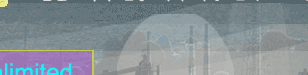| |
“저-, 잠깐만요?”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라 그런지 그녀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그냥 보낼라니깐 그러네예. 저기 형산강 다리까지만 바래다 줄께예. 그곳만 넘으면 괜찮을
것 같...”
채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난 그녀의 손을 덥석 움켜잡았다.
“고마워요.”
내심 혼자 가기가 두려웠던지 이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이제 누군가를 배려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에 왠지 모를 뿌듯함이 가슴 가득 피어올랐다.
우린 다시 손을 움켜잡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끝이 유난스레 차가웠다.
나는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픈 마음에 그녀의 손을 꽉 움켜잡은 채 연신 조물락거렸다. 그녀도 과히
그것이 싫진 않은 듯 손을 내맡긴 채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괜찮지예?”
“뭐가요?”
힐끗 웃으며 되묻는 듯한 표정에 난 서둘러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아이라예.”
사랑에 익숙치 못한 자들의 알량한 양심이라고나 할까? 연신 조무래기 손을 매만지며 그렇게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사실 전 이런 것에 익숙치 않거든요.”
“그건 저도 그래예.”
한결 누그러진 듯한 어투였다.
“그래예?”
우린 마치 꼭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동시에 웃었다. 사랑을 얻지못한 자들만이 가질수있는
환희였다. 길다랗게 사선을 그으며 세차게 몰아치는 빗발에 스커트 치맛자락이 그녀의 몸에 착 달라붙었다.
그녀는 그것이 애써 마음에 걸렸던지 간간이 멈춰서서 손으로 치마자락을 훑어내리곤 했다. 그럴 적마다
그녀의 하반신에 부디치는 나 자신이 부담스러워 옆으로 한걸음 설핏 물러섰다. 그러자 우산 난간에서 폭포수같은
빗물이 연신 나의 등걸을 타고 흘러들었다.
“그렇게 비 맞지 말고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무 내막 모르는 그녀는 자꾸만 잔인한 손길을 보내왔다.
“괜찮아요. 어차피 다 배린 몸인데요, 뭘.”
“그래도 머리는 젖지 않아야 해요. 그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여름감기는 약도 없다는데....”
그녀는 못내 마음이 아팠던지 나의 곁으로 바짝 다가와 한 손으로 나의 허리춤을 감싸안았다.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포근함이 아스라이 잦아들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다. 어둑어둑한
땅거미가 누런 황톳물 위로 가만히 내려앉고 있었다. ‘차라리 저 어둠이 온 사방을 까맣게 드리웠으면...’
새초롬히 돋아난 잔소름사이로 알 수 없는 훈훈한 열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넋이 나간 듯 한동안 무심코 걸어가다 쏴-아 물 흐르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저만치
앞에 후줄건히 내리는 빗줄기 사이로 철제로 된 다리가 어슴프레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꿈결처럼 감미로운
그 순간들이었건만... 우린 어느새 형산강 다리어귀까지 와 있었다. ‘이제 저 다리만 건너면...’
나는 못내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우산을 들어올렸다.
“저 다리 건너까지만 바래다 드릴께예.”
“괜찮아예. 안자 제 혼자 가도 돼예.”
“아닙니다. 저 다리를 넘어가다가 바람에라도 날려가면 어떡합니까?”
“그건 댁이 더 걱정되는데예?”
그녀는 깡마른 나의 체구에 허실삼아 농담을 던졌다. 그렇게 우린 실랑이 아닌 실랑이를 벌이며
다리위로 접어들었다. 다리위에 오르자 비바람은 더욱 거세어졌고, 비에 흠뻑 젖은 바지가랑이도 바람에
펄럭펄럭 나부꼈다. 거기다 철제로 된 난간사이로 비바람 소리가 어찌나 거세던지 그것은 마치 솜씨 없는
아이가 휘바람을 마구 불어대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가까스로 피하며 잰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형산강을 가득 메운 황톳물이 우리를 빨아들일 듯이 혀를 날름거리며 고개를 한껏 쳐들었다간
이내 아래로 사라졌다. 그렇게 연면히 고개를 쳐드는 물길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꼭 내가 그 속으로
빨려드는 것만 같았다. 거기다 고개만 살픗 아래로 수그리면 그대로 거센 물줄기를 타고 어디론가 둥둥
떠내려갈 것만 같은 분위기, 어릴 적 급류를 타고 앞개울을 가로
질러 건너던 그 아련한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높다란 언덕에서 첨벙 뛰어들면 이내 거센 물줄기속으로
이내 빨려들었고, 그 때 느끼는 그 짜릿한 기분은 재미를 넘어 황홀하기조차 하였다. 말 안장에 올라
탄 듯한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한동안 둥둥 떠내려 가다보면 둥그스름한 바위에서 대회전이 있었다. 미끄럼을
타듯 모퉁이를 돌아 아래로 쭉 타고 내려가자면 어느새 맞은 편 시냇가에 당도하게 된다. 그리고 물살이
느린 하류에 길게 늘어진 느티나무가 종착역이었다. 난 나무가지를 타고 올라와 다시 강을 건넌 뒤 또
첨벙 뛰어들고... 그러기를 얼마나 해댔을까? 배가 잔뜩 주려올 즈음이면 그 때서야 비로소 난 집으로
향했다. 누런 황톳물이 잔털에 잔뜩 달라붙어 식사를 마칠 때쯤이면 온몸은 온통 허연 분을 바른 것처럼
하얗고 퍼쓱퍼쓱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릴 적 그 추억에 녹아들었던지 눈알이 빙빙 도는 게
갑자기 누런 흙탕물이 예사롭게 보이질 않는게 아닌가! 그렇게 자꾸만 쏠리는 몸을 가까스로 가누며 황망한
순간들이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휘-이-잉!”
거센 빗줄기가 강바람과 한데 어울려 다리난간 사이로 거세게 몰아쳤다.
“조심하세요!”
바람결을 타고 아련하게 들려오는 그녀의 비명소리에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나는 고개를 내두르며
움찔 뒤로 물러났다.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우산이 세찬 비바람에 날려 저만치 휘-잉 날아가더니 어느새
강물 속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저만치 위에서 둥둥 떠내려 오던 우산이 다리교각에 부딪혀 몸을 한 번
뒤뚱 뒤틀고선 이내 아래로 빨려들어갔다.
“하마트면 큰 일 날 뻔 했어요.”
그녀가 저만치 아래에 떠내려가는 우산에 애써 시선을 떼놓으며 몸서리쳐댔다. 그랬다. 연속으로
밀려 내려오는 물살을 가만히 바라보노라면 마치 자신이 둥둥 떠내려가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마련이다. 거친
격랑을 헤치며 미궁 속을 마냥 헤매고 있는 우리네 인생사, ‘도대체 저 두려움의 끝은 어디일까?’ 쉴새없이
몰아치는 동해안 바닷바람은 연신 물속으로 들어가 보라 나의 등을 떠밀었고, 갈 길 먼 그녀는 자꾸만
나의 손을 잡아끌었다. |
|